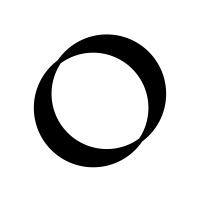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 대표이사
- 유석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8
- TEL
- 1588-7667 (유료)
- kolonmall@kolon.com
-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7-서울강남-02297호
- 사업자등록번호
- 138-85-19612

코오롱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유효기간 2023. 10. 04 ~ 2026. 10. 03
ⓒ BY KOLONMALL. ALL RIGHT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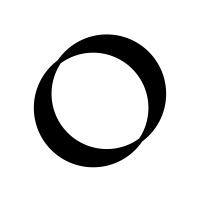

ⓒ BY KOLONMALL. ALL RIGHT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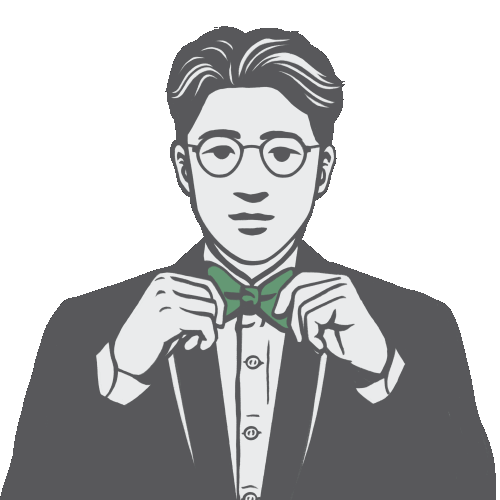
이우성은 시인이다. <GQ> <ARENA HOMME+>의 피처 에디터로 일했다. 공간, 사람, 본질적인 생각들에 대해 탐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여러 매체에 기고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크루 <미남컴퍼니>의 대표다



첫번째 댓글을 달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