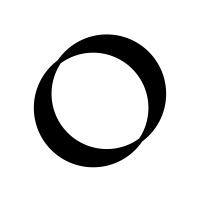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 대표이사
- 유석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8
- TEL
- 1588-7667 (유료)
- kolonmall@kolon.com
-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7-서울강남-02297호
- 사업자등록번호
- 138-85-19612

ⓒ BY KOLONMALL. ALL RIGHT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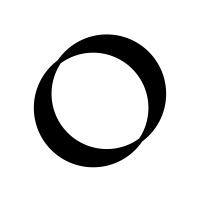

ⓒ BY KOLONMALL. ALL RIGHT RESERVED
약 십 수년 전인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는 남성 연예인들이 앞다투어 티셔츠를 찢으며 남성성을 과시하던 게 유행이었다. 그때는 가슴 근육을 냄비 뚜껑만하게 키운 남성 아이돌들이 격렬한 춤을 추다 마지막에 입고 있던 티셔츠를 찢으며 공연의 절정을 알리곤 했다. 관련 이미지를 찾아보면 무대 위에서 단체로 티셔츠를 찢는 사진도 있다.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곤 한다. 뭔가를 찢는 것과 큰 가슴 근육과 남성성과 섹시함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오늘 이야기도 찢어지는 티셔츠에서 출발한다. 왜 짐승같은 남자 아이돌들이 티셔츠를 찢는 걸까? 왜 셔츠나 재킷을 찢지는 않을까? 이런 이유를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티셔츠 원단의 특징과 좋은 티셔츠에 대해 닿을 수 있다.
옷 찢기 퍼포먼스가 유행하던 시절 남자 아이돌의 티셔츠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몸에 붙는 옷이라는 점. 몸에 붙는 민소매나 짧은 반팔 소매 티셔츠를 입은 경우가 많았고 그 옷이 젖어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입은 것보다 더 야릇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다. 내가 눈여겨본 건 옷의 신축성이다.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근육질 남성의 울퉁불퉁한 몸에도 신축성 있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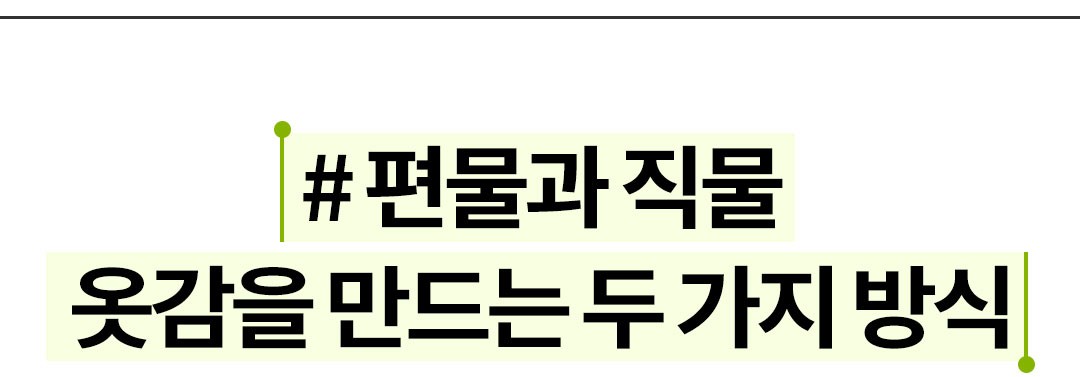
이 신축성이 티셔츠 원단의 핵심이다. 티셔츠 중에는 면 100%가 많은데, 면 100%셔츠는 안 늘어나는데 면 100% 티셔츠는 늘어난다. 왜일까? 답은 옷감을 만드는 두 가지 방식에 있다. 옷감, 즉 원단은 직물과 편물로 구분된다. 직물은 실을 가로와 세로로 계속 교차시켜 만드는 옷감이다. 편물은 한 방향에서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 안에 계속 실을 짜 넣으며 만드는 옷감이다. 직물은 실을 교차시켰기 때문에 단단하고 튼튼한 대신 구조적으로 신축성이 없다. 편물은 반대다. 실의 고리들이 겹쳐진 모양이니 신축성이 있고, 그만큼 직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튼튼하다. 면바지와 티셔츠의 내구성을 비교해 생각해보면 실감이 날 것이다.
햇빛에 비추어 보면 원단의 짜임 구조를 확실히 알 수 있다. 경사와 위사로 짜낸 직물과 니트 가공으로 만들어낸 편물은 짜임이 확실히 다르다.
이 신축성은 티셔츠의 특징을 넘어 티셔츠가 존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서양의 실내복은 셔츠 형태로 발전했다. 신축성이 없는 직물로 옷을 만들기 때문이었다. 신축성이 없는 직물로 옷을 만드니 몸이 옷을 전부 감싸려면 별도의 단추로 옷감들을 여며줘야 했다. 티셔츠는 신축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앞 단추를 만들지 않고 위에서부터 덮어쓰는 방식으로 입을 수 있다. 영미권의 옛날 소설이나 의류를 뜻하던 말 중 '풀오버 셔츠'라는게 이 뜻이다. 풀오버 셔츠는 '덮어쓰는 셔츠'니까, 단추로 여미는 셔츠의 반대 개념이다.
코튼 저지의 특징인 신축성과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진. 옷감을 고리에 매달아두고 당겼다가 손을 뗐을 때의 모습이다. 완만한 주름이 순간 생겼다 사라지는 것에서 평직의 유연성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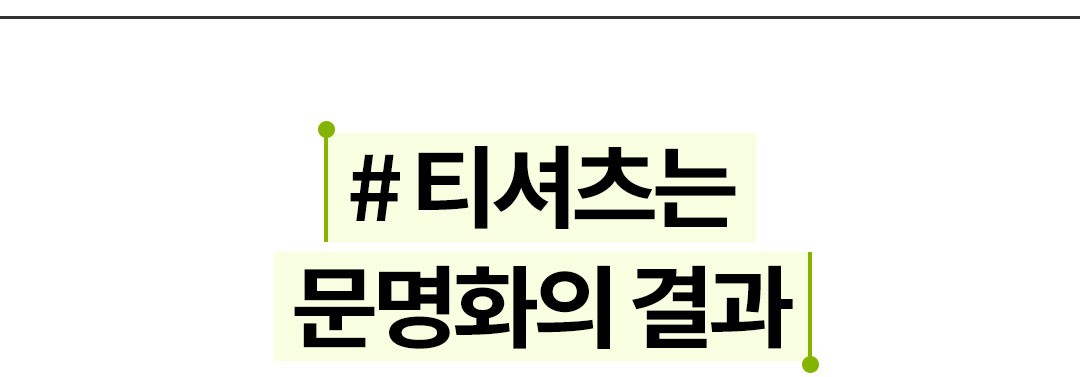
문명은 한번 편안해지면 역행할 수 없다. 신축성이 있는 원단이 티셔츠라는 옷으로 쓰이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티셔츠를 입게 되었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 한국의 근육질 가수들이 옷을 찢는 퍼포먼스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옷은 복잡한 상품이다. 의류산업에서 우리가 사서 입는 옷 한 벌은 의류산업의 복잡한 가치사슬이 치밀하게 작동한 결과다. 면 티셔츠 한 벌만 생각해봐도 이 복잡한 시스템을 알 수 있다. 면 티셔츠의 면은 면화로부터 시작한다. 면화는 가공 공정을 거쳐 실(원사)이 된다. 실들을 짜면 옷감(원단)이 된다. 원사나 원단 단계에서 옷을 염색하거나 다양한 표면 가공을 하기도 한다. 그 모든 일정 공정을 거친 원단이 옷의 재료다. 이 재료를 재단하고 누군가 옷의 형태로 만들어야 한 벌의 옷이 된다. 만들어진 옷을 누군가는 홍보도 하고 가격 할인 정책도 하다 보면 그 옷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 복잡한 물건의 흐름 중 원단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다.
다양한 색의 코튼 저지 원단. 옷 만들기의 복잡성을 유추할 수 있다.
티셔츠의 원단을 이야기할 때 '면 100%'라고 하는 건 재료 함량의 문제다. 밀가루로 파스타를 만들 수도 있고 수제비를 만들 수도 있듯, 면사는 바지가 될 수도 있고 티셔츠가 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방직 방식이 중요하다. 티셔츠에 쓰는 원단은 '환편 코튼'이라 부르는 게 정확하다. 환편은 편물을 만드는 방식 중 하나다. 환편의 '환'은 둥글 환(丸)자다. 둥근 기계가 헬리콥터 날개처럼 제자리에서 돌면서 실을 회전시켜 편직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환편 방직기는 영어로도 '써큘러circular 니팅 머신(원형 니팅 머신)'이라 부른다. 이 개념이 일본으로 넘어오며 '큰 동그라미'라는 '다이마루(大丸, 한국어 한자 발음으로는 대환)'라는 이름이 생기고, 그래서 한국에서 아직도 '티셔츠에 쓰는 환편 코튼 니트 소재'를 다이마루라 부르게 되었다.
티셔츠용 면 100%, 즉 '환편 방직기로 만드는 코튼 저지 소재’ 안에서도 변수가 다양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수는 실의 굵기다. 국수 굵기에 따라 식감이 달라지듯 실의 굵기에 따라 옷감의 느낌도 달라진다. 실의 굵기에는 '~수'라는 말을 쓴다. 면 1파운드에서 뽑아낼 수 있는 실의 단위를 말한다. 면 1파운드에서 뽑는 실의 수를 1수라 했을 때, 그보다 10배를 뽑으면 10수고 20배를 뽑으면 20수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실이 가늘다. 같은 양의 면에서 더 많은 실을 뽑는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10수 코튼이 20수보다 두껍고, 20수 코튼이 30수보다 두껍다.
색이 같고 실 굵기가 다른 원단을 비교한 장면. 왼쪽부터 20수, 30수, 40수다. 실이 조금씩 얇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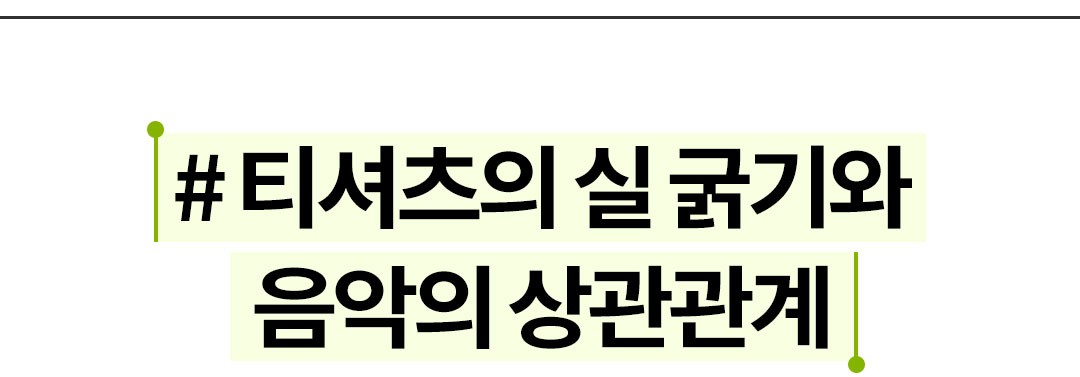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면 티셔츠의 실 굵기는 음악인들의 음악과 관련이 있다. 힙합은 10수나 20수 면 티셔츠를, 락이나 어쿠스틱은 30수나 40수 티셔츠를 곧잘 입는다. 제이-지의 티셔츠와 크리스 마틴의 티셔츠를, 혹은 켄드릭 라마와 브루노 마스의 티셔츠를 비교해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재즈 음악인들은 티셔츠를 입는 사람과 안 입는 사람이 반반인 것 같고, 클래식 연주자들은 웬만하면 능직으로 만든 셔츠를 입는다. 하긴 누군가가 크리스 마틴풍 티셔츠를 입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9번을 친다면 그 모습은 별로 상상하고 싶지는 않다.
워싱 여부에 따라서도 면의 색이 달라진다. 왼쪽이 워싱한 면이다. 확실히 색이 밝아지고 채도가 빠진 걸 볼 수 있다.
실의 굵기만이 변수가 아니다. 우리가 집에서 옷을 빨면 옷의 색깔이 빠지거나 원단이 보들보들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원단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실이나 원단을 한번 빨면 쨍하던 색이나 원단의 질감이 조금 부드러워진다. 그게 워싱 가공이다. 규모가 있는 원단 제조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환편 코튼 니트 원단의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낸다. 색상 종류, 워싱 유무, 실의 굵기 등 각종 변수를 감안하면 원단의 다양성은 삼차함수적으로 올라간다. 거기 더해 실제 원단의 세계에서는 면 100% 말고 폴리에스테르, 스판덱스 등 다양한 소재를 더할 수도 있다. 아울러 요즘은 지속가능성이 화두인 만큼 원사의 제작이나 염색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것이 중요 목표인 곳들도 많다.
염색과 실의 굵기에 따라 코튼 저지 소재는 다양히 변할 수 있다. 저 정도 두께와 색이라면 속살이 비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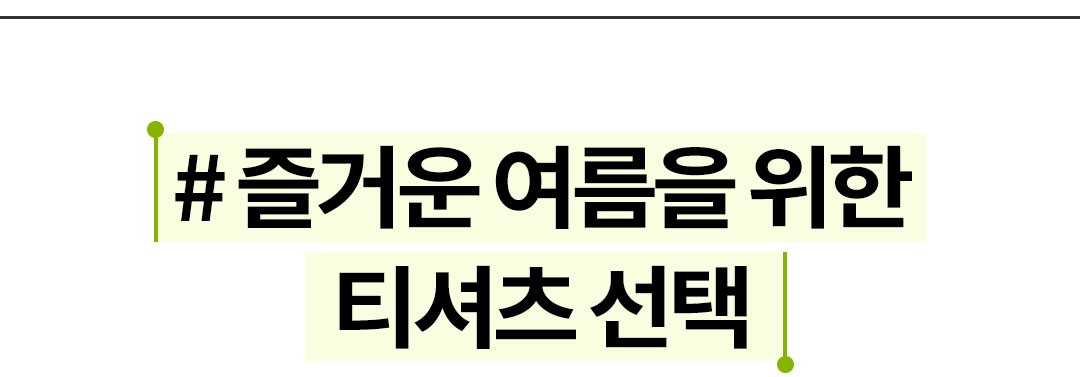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숙지할 필요는 없다. 그저 알아두면 좋은 건 10수, 20수 등 실의 숫자다. 실의 크기가 커질수록 원단이 얇아지고, 그런 만큼 옷 속의 살이 더 비칠 수 있다. 요즘은 성별을 불문하고 여러 이유로 여름 티셔츠를 입을 때 유두가 비치는 걸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색이 어두운 10수나 20수 면 티셔츠를 고른다면 몸 속이 비칠 걱정 없이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댓글을 달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