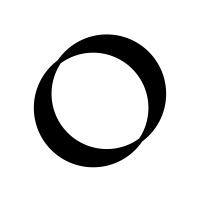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 대표이사
- 유석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8
- TEL
- 1588-7667 (유료)
- kolonmall@kolon.com
-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7-서울강남-02297호
- 사업자등록번호
- 138-85-19612

ⓒ BY KOLONMALL. ALL RIGHT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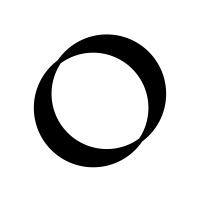

ⓒ BY KOLONMALL. ALL RIGHT RESERVED
“저는 말했습니다. '데이빗, 사랑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뉴욕 양키스 야구 모자는 안 쓸래요. 못 쓰겠어요. 그걸 쓰면 크게 알려질 거에요. (그게 알려졌을 때의)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못 씁니다.' 그래서 그걸(모자를) 쓸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것이다. 대화 속 ‘데이빗’은 영화감독 데이빗 핀처다. 야구모자를 안 쓰겠다는 남자는 배우 벤 애플렉이다. 상황은 영화 <나를 찾아줘(2014)>에서 벤 에플렉이 야구 모자를 쓰는 장면을 촬영할 때다. 벤 애플렉은 이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스케줄을 10개월이나 미루었다고 하니 '영화를 위해 뭐든 할 수 있다'는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니다. 그러나 벤 애플렉은 유명한 보스턴 레드삭스 팬이다. 숙명의 라이벌인 뉴욕 양키스의 모자를 도저히 쓸 수 없다. 결국 벤 애플렉은 영화 속에서 뉴욕 메츠의 야구 모자를 쓴다.
1. 오늘의 시각적 주인공인 코오롱스포츠 볼캡. 볼캡의 기본이 잘 구현되어 있다.
2. 보통 로고나 메시지가 들어가는 부분. 요즘은 이 볼캡처럼 특정 문장을 적는 경우도 많다.
볼캡의 여러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이 모자가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의 얼굴을 본다. 얼굴 위의 머리에 쓴 모자는 누구에게나 눈에 띈다. 그 머리에 뭔가 적혀 있다면 읽게 된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적힌 빨간 모자를 쓴 도널드 트럼프가 대표적인 예다. 문장을 적어둘 필요도 없다. 제이-지는 '내가 죽으면 뉴욕 양키스 모자를 씌워줘' 라는 가사를 적으며 자신의 출신지인 뉴욕을 드러냈다. 꼭 출신지와 연관될 필요도 없다. 올 상반기 최대 유행어로 기록될 "맞다이로 들어와."가 나온 민희진의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파란색 LA 다저스 볼캡이 눈에 띄었다. 무라카미 다카시가 만들어준 민희진의 캐릭터도 파란 볼캡을 쓰고 있다.
남녀노소 쓰는 액세서리가 되었으나 볼캡은 야구라는 특정 종목의 모자다. 이름에 아직 '볼'이 남아있는 것부터 이 모자의 뿌리를 알 수 있다. 야구는 지역 기반 프로 스포츠이니 여러 야구팀들이 팀의 색과 로고를 담은 야구 모자를 출시한다. 뉴욕의 제이-지는 말고도 다양한 래퍼들이 자신의 출신지를 소재로 랩을 하고 캐릭터를 만든다. 야구 모자는 그때 늘 눈에 띄는 소품이다. 닥터 드레의 LA, 신시내티의 릴 웨인처럼. 스포츠 용품이 퍼스널 브랜딩의 일환이 된 것이다. 스포츠 용품이 퍼스널 브랜딩의 일환이 되는 경우는 많고, 볼캡도 그 경향의 일환이라 볼 수도 있다.
코오롱스포츠 로고가 귀엽게 자리잡고 있다.
볼캡도 처음부터 지금 모습은 아니었다. 130년 이상의 진화를 거쳐 지금의 볼캡이 되었다. 1800년대의 야구 선수들은 밀짚모자를 쓰고 경기를 했다고 한다(그때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 흰 셔츠에 울 바지를 입고 밀짚모자를 쓰고 있어서 오늘날의 프레피 룩에 더 가까워 보인다). 야구 선수가 모자를 써야 했던 이유는 철저히 기능이었다. 공중에 떠 있는 플라이볼을 잡으려 하늘을 볼 때 눈이 부시기 때문이다. 그런 필요 끝에 밀짚모자까지 쓰고 나오게 된 것이다. 밀짚모자에서 챙이 짧은 원통형 모자 등의 여러 변형을 거쳐 지금 모습의 야구 모자가 나오기 시작한 건 1895-1900년이다. 모자에 로고가 처음 새겨진 건 1902년이다. 모자 전문 브랜드 뉴에라의 대표적인 야구 모자 중 하나인 '59피프티'가 정식 데뷔한 시점도 1954년이다. 딱 70년 전이다.
볼캡이라는 형식이 생긴 지도 약 120년이나 된 만큼 모든 볼캡은 품질 면에서 상당히 상향평준화되었다. 당장 생각해봤을 때 볼캡이 못 쓰게 될 만큼 망가져서 버리는 일은 거의 없다. 오염되었거나 마음이 바뀌었다면 모를까. 기능과 평균 완성도 면에서 볼캡은 이미 완성된 물건이라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볼캡의 기준'같은 걸 굳이 이야기하기도 애매하다. 저렴한 볼캡이라도 봉제나 재단 등 의류의 기본은 모두 충실히 구현된 편이다.
1. 챙은 자연스럽게 휘어 있다. 어떤 챙을 좋아하는지는 개인 기호지만 쓸 때 이게 편하다.
2. 이 볼캡은 면 소재라 땀이 나가는 구멍을 따로 만들어 두었다.
3. 모자의 뚜껑 부분. 이 부분이 튼튼하게 조립되어 모자의 내구성을 만들어준다.
4. 땀 처리의 디테일. 머리에 감겨 땀이 모자에 스며드는 걸 막아 준다. 이 디테일은 뒤로 보이는 실밥을 가려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볼캡에 대해 따져 본다면 품질보다는 각 요소가 자신의 기호나 상황에 맞는지가 더 중요하다. 챙은 얇게 휘어지거나 두껍게 ㅡ자를 그리는 형태다. 둘 중 무엇이 좋은지(혹은 ㅡ 자 챙을 휠 것인지). 모자의 깊이는 깊은 게 좋은지 얕은 게 좋은지. 원단은 면이 좋은지(통기성이 좋다), 나일론 등의 화학섬유계 소재가 좋은지(가볍다), 혹은 조금 더 두툼한 울이나 플란넬 등이 좋을지(무겁고 비싸나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 등을 생각해보면 된다. 막상 써보면 원단의 종류 뿐 아니라 원단의 두께도 착용감에 영향을 미친다. 같은 면 계열 볼캡이어도 두께에 따라 착용감과 실루엣이 달라질 수 있다. 볼캡 뒤쪽의 사이즈 조절 부위에도 변수가 많다. 일단 사이즈가 조절되는 모자와 아닌 모자가 있고, 사이즈 조절이 된다고 해도 종류가 다양하다. 그런 요소들 사이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 찾아 나가면 된다.
1. 각 부분별로 모자를 분해해본 모습. 기본적인 6피스 모자다. 볼캡의 표준.
2. 코오롱스포츠는 사이즈를 M과 L로 구분하고 각 모자에 사이즈 조절 밴드까지 달았다. 세심하다.
온라인 쇼핑이 아무리 활성화되어도 스타일로의 모자를 쓴다면 결국 써 봐야 알 수 있다. 실루엣이 신경 쓰인다면 모자는 가서 써보는 게 낫다. 모자마다 깊이와 모양이 다르고 모든 사람의 머리 모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어울리는 볼캡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안 어울릴 수 있다. 모든 옷이 그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티셔츠나 신발에 비해 모자는 훨씬 개인별 편차가 크다.
볼캡은 의외로 한국과도 연관이 있다. 한국의 영안모자는 1년에 1억개 이상의 모자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 외에도 한국에도 여전히 모자를 생산하는 곳이 많이 있다. 제조업이 한국을 떠나는 추세라 해도 여전히 서울에서 볼캡을 만드는 젊은 기업인 역시 있다. 양화대교 남단 영등포에 있는 양화모자 대표 한가람은 아직 30대 후반이다. 그는 서울 시내에 모자 공장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장점이라고 한다. 다양한 다품종 소량 생산이나 미팅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자처럼 특수한 기능을 가지면서 패션의 한 요소로 역할을 수행하는 건 안경도 마찬가지일 테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안경은 모자와 비교하면 장치산업에 가깝다. 뿔테(플라스틱 사출) 안경을 새로 디자인하려면 금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제작비가 만만치 않다. 금형을 한번 만들면 많이 찍어야 채산이 맞기에 앞서 말한 다품종 소량 생산이 불가한 구조다. 더구나 소비자 입장에서 안경은 패션의 요소이기에 앞서, 여전히 기능적인 역할이 두드러지므로 트렌드 주기가 빠르지도 않고 말이다.
볼캡은 생각할수록 신기한 물건이다. 어찌 보면 볼캡을 이루는 모든 요소가 이 물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야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도 볼캡은 쓴다. 뉴욕에 안 가 봤거나 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NY가 적힌 볼캡을 잘 쓰고 다닌다. 야구장을 떠난 야구 모자는 ‘햇빛을 가려준다’는 기능성과 ‘얼굴을 가려준다’는 필요성의 교차점 위에서 현대인의 갑옷이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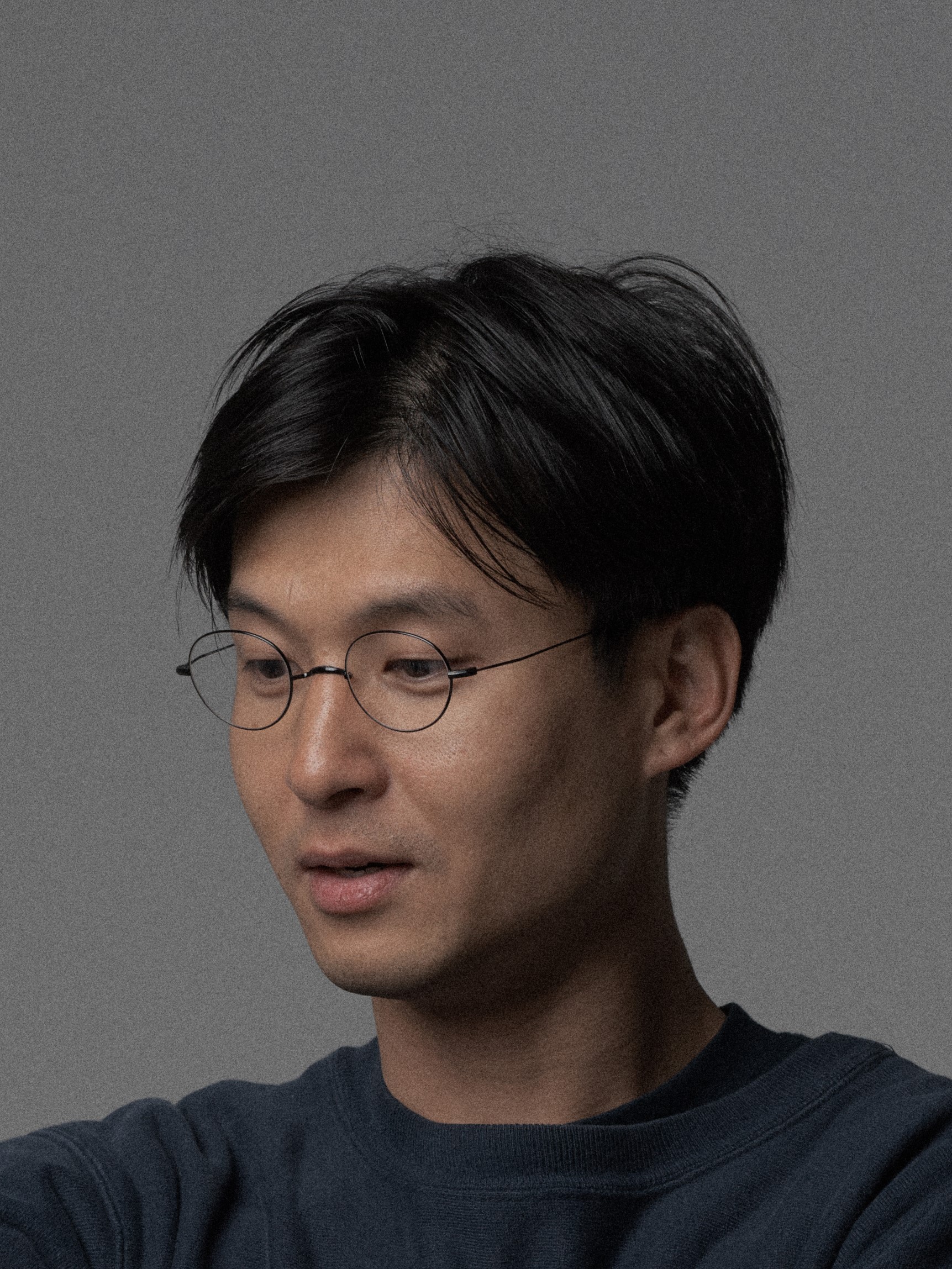
정보를 찾고 정리해 페이지를 만듭니다. 에디터로 일하며 각종 매체에 원고를 기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이채로운 포트폴리오를 가진 사진가 중 한명입니다. 유명 K팝스타부터 길가의 고양이와 한강의 표면까지, 그의 눈과 렌즈를 거쳐 조금 다른 사진을 만듭니다.

첫번째 댓글을 달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