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하울` `꼭 사야 하는 추천템` `왓츠 인 마이백` 등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하려는 콘텐츠가 SNS와 유튜브 플랫폼에 넘쳐난다. 그 물건들이 얼마나 남다른 가치를 지녔는지 설명하고, 유의미한 소비였음을 설득하려 한다. 이런 종류의 콘텐츠가 끊임없이 생산된다는 건, 그만큼 찾아 즐겨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일 테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을 `손민수`하고, 아이템을 찾기 위해 정보의 바다를 휘젓는 게 유행인 요즘이니까. 때문에 취향은 유사해지지만 그걸 알아챌 새도 없이 `다름`을 흉내낸 스타일이 타임라인을 뒤덮는다. 그래서일까. 소유해야만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은근슬쩍 소비를 부추기는 극성맞은 자본주의에 나는 꽤 시니컬하고 시큰둥해졌다. 가진 게 별로 없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패션 에디터가 직업인 사람의 다소 모순적인 가치관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나는 2년 전 미니멀 라이프를 예찬하는 글을 쓴 적이 있다. 국내 최고 패션지에서 최신 트렌드를 전달하고 소비를 유도해야 할 패션 에디터가 쓴 `비움의 삶`이라니, 기사를 읽던 팀 선배가 “말이 되냐”며 코웃음을 쳤다.
돌이켜보면 과거의 나는 쏟아지는 신상품과 트렌드를 따라 급변하는 패션계의 분위기에 도취되어 부지런하게도 많은 물건을 사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입지 않는 옷과 쓰지 않는 물건으로 포화 상태가 된 방에 들어서며 `현타`를 느낀 것이다. 때마침 비우는 삶에 대해 말하는 몇 권의 책을 접하고 본격 미니멀 라이프에 빠지게 되었다. 물론 미니멀한 삶을 꿈꾸면서도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물욕을 잠재우지 못해 밤새 눈에 불을 켜고 위시리스트를 채우거나, 순식간에 집 앞에 쌓인 택배 상자를 노려보며 괴로워하기도 했다. 순간적으로 솟구치는 소유의 욕망은 그 범위가 넓고도 다양했다. 패션은 물론이고 식품, 가전, 좋다고 `들었던` 잡다한 아이템들을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삭제하기를 반복했다. 호르몬의 노예가 되어 충동적으로 구매한 냉동식품들과 거대한 가구를 부둥켜안고 후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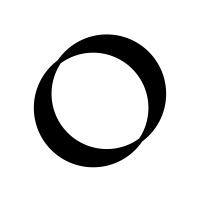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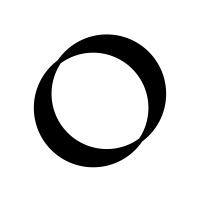


첫번째 댓글을 달아보세요!